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에너지신문]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최근 대기정체로 인해 전국을 덮치기 시작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전북 등지 미세먼지 농도는 70~100㎍로 올 가을들어 가장 높은 수치까지 치솟았다. 초미세먼지 PM2.5의 농도가 90㎍ 수준이면 매연이 가득한 터널에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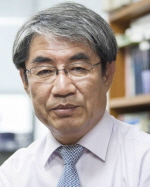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환경부는 직접 내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심각한 문제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만들어지는 `2차 생성물(간접배출)’은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일부 환경단체 등은 경유차를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다.
환경부도 경유 가격 인상 시도에 실패했지만 노후 경유차를 강제로 퇴출시키거나 상당한 환경개선분담금을 부과하고, 신규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도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부 입장이 절박하다는 점은 이해된다. 유럽산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경유차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정서일 수 있다. 그렇다고 경유차 문제를 과도하게 과장해서 모든 경유차가 마치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잘못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유의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는 경유의 쓰임새가 있다. 경유차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지난 정부에서 2009년 `클린디젤`을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시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추진된 과거의 선택을 무작정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을 믿은 소비자를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환경 파괴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범처럼 취급해서도 안 된다.
합리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선 정확한 정보는 필수다. 유럽이 적극 경유차를 거부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영국 런던 운행제한구역(LEZ)은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유로3 이상 미세먼지 배출 기준에 따라 생산된 경우에는 경유차라 해도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현실상 경유를 포기할 수 없는 자동차도 있다. 대형 트럭과 건설·농업용 중장비 차량의 경우 경유 엔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일정한 구간을 운행하지 않는 관광버스나 비사업용 대형버스도 마찬가지다. 환경부가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가스(CNG, LPG) 연료가 대안이 될 수도 없다.
CNG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소비량의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소비를 늘이는 것도 현명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맹목의 경유차 거부는 국가 연료 수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정유사가 생산하는 경유의 양은 휘발유보다 갑절 이상 많다. 경유의 국내 소비를 억제하면 정유사는 더 많은 경유를 수출해야 하고, 그래야 기업 이윤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은 CNG와 LPG는 더 많이 수입해야 된다.
경유는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연료가 아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로6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일이 현실에 맞는 대안이다.

